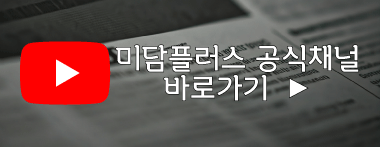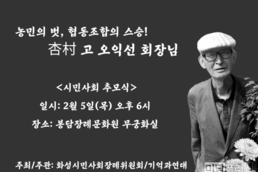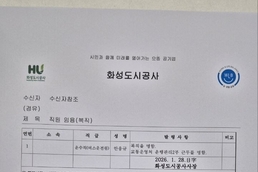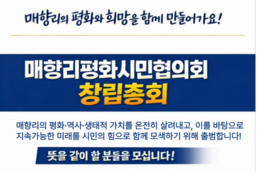노년의 시간은 더디고 고요하다. 휴일의 한낮은 무료하다. 아내와 딸에게 외식하자고 부추겼다. 맛이 괜찮다고 셋이 의견 일치를 본 곳이 화덕피자 집이다. 아내와 딸은 외출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동작이 굼떠서 딸에게 핀잔을 듣는다. 길에서도 내 걸음은 느려 뒤처진다. 젊었을 땐 서로 보폭에 맞추어 잘 걷고 늘 손도 잡고 걸었는데, 요즘은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가는 마음이 편안하다.
피자집에 도착하고 자동차에서 내린 아내와 딸이 잠깐 나를 기다리는 동작을 취한 듯하더니 이내 들어가 버린다. 그런 아내가 전혀 고깝지 않다. 피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문득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와 나는 이렇듯 편하게 살아가고 있다.
십여 년 전, 아내가 친구들과 유럽 여행 중에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한동안 계단을 오르내릴 때면 내가 부축해 줘야만 했다. 아마도 그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저 덤덤하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감정의 자잘한 구석까지 들여다보면 내가 부족한 점이 많았기에 혹 아내가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한때의 사랑은 아스라이 사라져 버렸고 미운 마음이 많아졌을 지도 모른다.
그동안 아내와 사십여 년 세월을 살면서 사랑이었든, 미움이었든 이제 그런 건 상관없다. 내가 아내를 더 사랑했으면 어떻고, 아내의 미움이 더 컸다면 어쩌랴?
그걸 어떻게 따질 필요가 있나? 아내와 내가 여기까지 무탈하게 함께한 세월이 너무 소중하기에 요즘은 아내를 더 많이 기다려 주고 잘 살핀다. 그래야만 마음이 편안하다.
화덕피자가 나왔다. 아내와 딸은 맛있다고 무척이나 잘 먹는다. 전에는 피자가 아들의 최애 음식이었지만, 오늘은 아내와 딸이 피자 맛에 감동했는지 표정이 흐뭇하다. 아내는 피자가 맛있다면서 나더러 ‘맛이 어떠냐?’라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내는 내가 대답하지 않아도 그뿐이다. 굳이 내 대답이 필요한 건 아니었다. 매사가 그렇다. 나는 그게 섭섭하지도 않다. 서로 살면서 ‘매사가 그렇다’란 그저 무덤덤하거나 지나치게 건조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늘 서로 함께하기에 완전하게 신뢰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다.
신혼 초, 부엌엔 구들장 밑으로 바퀴 달린 연탄을 깊이 밀어 넣어 방을 데우는 단칸방에서 생활했고, 음식을 만들 때는 석유풍로를 사용했다. 신혼 단꿈에 빠졌던 우리에게 단칸방은 지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그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신의 선물인 아들이 태어났고, 늘 선물을 품에 안고 눈을 맞추며 생명의 신비를 뼛속까지 새기면서 간절하게 살았다. 한편으로는 무언가를 잔뜩 벼르면서 좀 더 이루고자 했던 옛날이 있었기에, 지금의 여유가 생겼고, 이젠 빨리 체념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보니 어느 결에 흰머리도 늘어났다. 하지만 미래를 꿈꾸면서 늘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온 지난날처럼 살지는 못한다. 지향하던 꿈은 이미 내 몸에서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나는 지금의 삶이 좋다. 이제 뭘 더 이루지 않아도 된다. 부자는 아니지만 배고프지도 않다. 평생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과 현재의 지갑 또한 얄팍하지 않다. 하지만 아내와 나는 성인병 두어 가지를 지니고 산다. 때가 되면 병원에 가고, 처방된 약을 핸드폰 알람에 맞춰놓고서 착실하게 챙긴다. 병이 더 생기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보이지 않는 병이 나타나도 이젠 어쩔 수 없다. 마음도 몸도 세월 따라 흐르는 것 일뿐이라고 생각하며, 그저 받아들일 뿐이다.
혹 내가 이런 생각으로 산다고 마치 만사에 달관한 것 같이 들릴까봐 민망한 느낌도 없지 않다. 하지만 결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던가.
또 하루가 저물어 간다. 유리창으로 번지는 저녁노을의 형상이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검붉기도 하며, 주홍으로 번지기도 하고, 핏빛으로 타오르기도 한다. 힘이 빠지는 허망한 빛의 유희, 그 아쉬움의 틈새에서 노년을 살아내고 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욕심부리지 않고 마음을 비우면서 남아있는 날들을 평화로이 사는 것이 내게는 큰 소망이다. 살면서 그저 너그러운 어른이 되는 것 또한 간절한 바람이다. 오늘도 아내를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아내는 나를 보면서 살며시 웃는다. 이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우린 서로 잘 살아내고 있다.
수필가 김종걸
격 월간지 〈그린에세이〉 신인상으로 등단.
현) 한국문인협회, 경기한국수필가협회, 그린에세이 작가회 회원.
현장경찰로 34년 근무 후, 경정(警正)으로 퇴직
<수상>
2014년 제17회 공무원문예대전(현, 공직문학상)수필부문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2016년 제17회, 2018년 19회, 경찰문화대전 산문부문, 경찰청장상 수상.
2021년 경기한국수필가협회 수필공모 우수상.
2019년 대통령 녹조근정 훈장 수상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